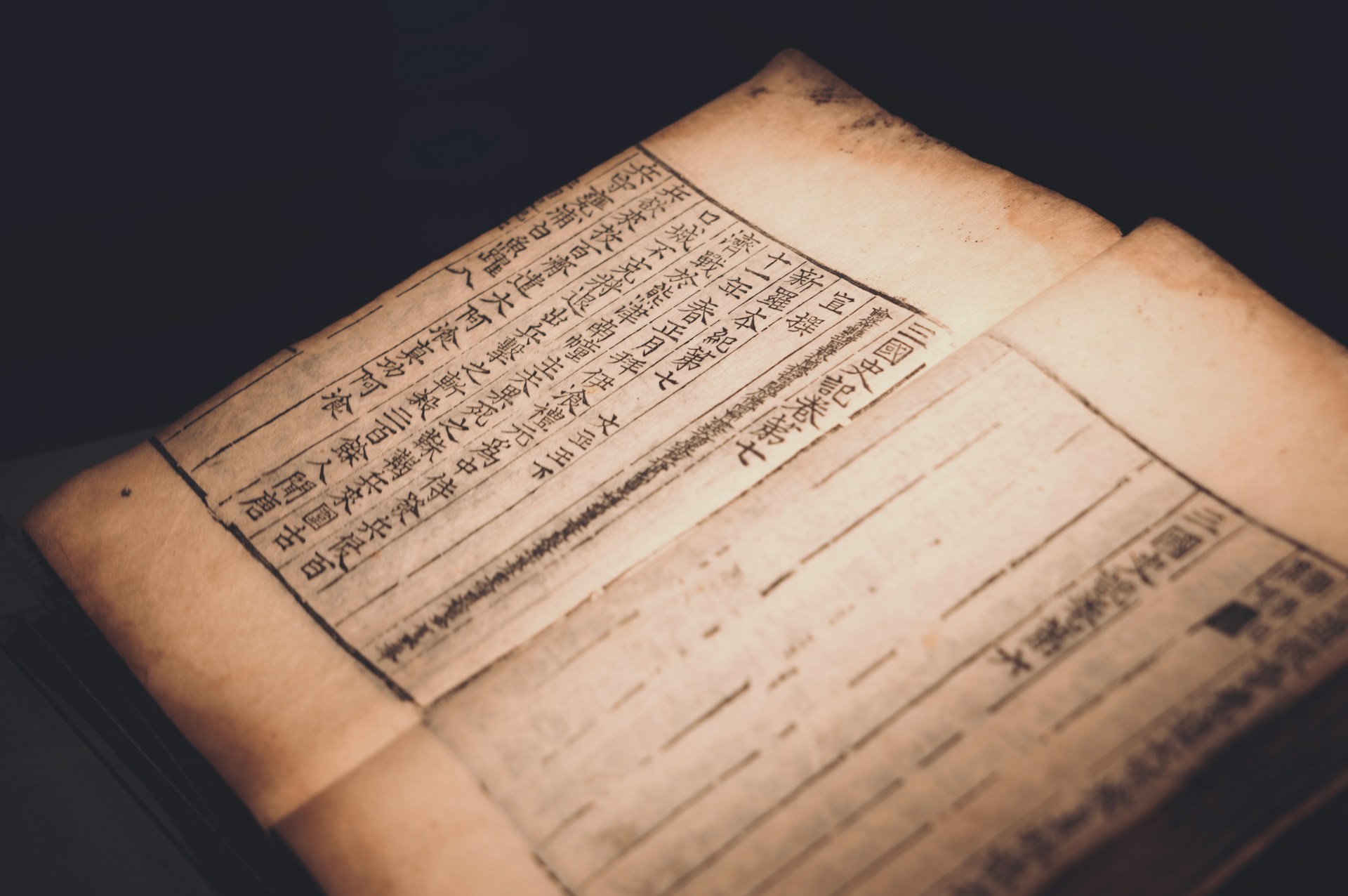한국 나이 계산법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면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온다. “왜 그렇게 계산해?” 나는 종종 농담 삼아 이렇게 대답한다. “한국인은 워낙 급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이를 세기 시작하거든.” 물론 농담이지만,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시계가 빠르게 흐른다.
이러한 속도감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성과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최근 “한국은 참을성이 없지만, 그게 장점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이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콘텐츠 산업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빠른 속도, 지속 가능할까?
한국에서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진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가 싶으면 금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영화의 성패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도 전에 판가름 난다. 미국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유명한 대사처럼, “성대한 개업… 그리고 빠른 폐업”이 반복된다.
끊임없는 혁신과 즉각적인 성과를 좇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요소를 놓칠 위험이 있다. 깊이 있는 고민과 장기적인 전략 없이 속도만 강조하는 발전은 결국 일회성 유행과 소모적인 경쟁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바쁜 것이 곧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 이토록 빠른 속도가 과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일까?
속도가 전부가 아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그의 저서 행복 가설(The Happiness Hypothesis) 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원을 차지하고, 쾌락과 명예를 위해 경쟁하는 개인으로 진화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집단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랑과 유대감을 필요로 하며,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 비로소 몰입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수를 태운 코끼리와 같다. 기수는 논리와 계획을 대표하고, 코끼리는 본능과 감정을 상징한다.”
하이트가 말했듯, 한국 사회도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려는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이 거둔 성공은 이러한 속도전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속도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속도와 균형을 맞출 때
해결책은 시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균형 감각에 달려 있다. 혁신이 방향성을 갖고, 발전이 목적을 동반할 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